이화의료역사이야기
동대문부인병원에서 활동을 시작한 한국인 첫 여성 약제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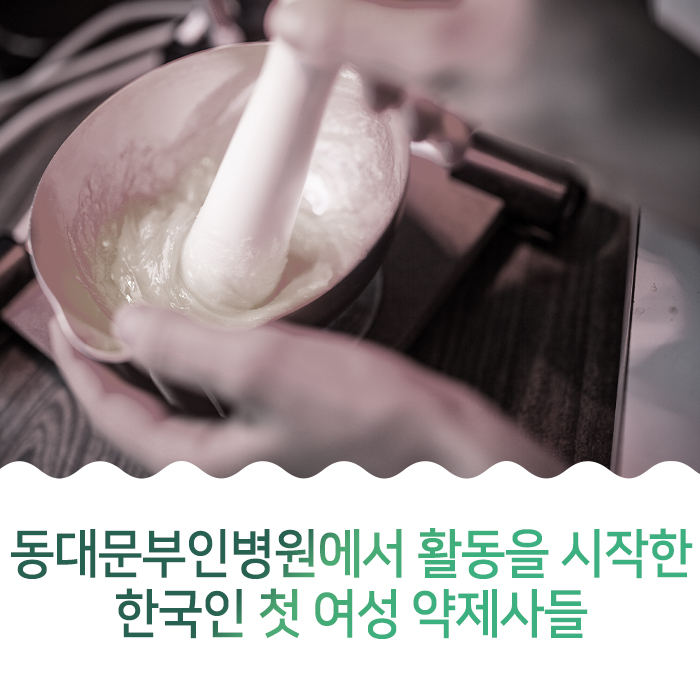
우리는 흔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사, 간호사만을 떠올리지만 이화의료원과 같은 종합병원에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근무하며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달 역사속으로에서는 그 가운데서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보구녀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볼드윈진료소, 릴리안해리스기념병원(동대문부인병원)으로 이어지며 병원의 규모와 진료활동이 체계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약제사’(藥劑師)라는 새로운 직종이 병원에 등장하게 된다. (약제사란 현재의 약사(藥師)를 칭하는 용어로 대한제국기부터 1954년 <약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 용어인 ‘약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약제사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양성·배출되었을까?
전통적으로 한약재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했던 조선에 개항 이후 양약(洋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약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주로 서구식 의료기관과 일본인 매약상들을 통해 보급되기 시작한 양약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양약의 사용과 취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7년 대한의원 내에 교육부를 설치해 약제사를 양성할 계획을 세웠다. 대한의원 교육부는 1910년 2월 대한의원부속의학교로 개편되며 그 안에 약학과를 설치하였지만 그 해 8월 한일강제병합으로 부속의학교가 폐지되면서 근대적 약학교육은 시작되지 못했다.
양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약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한약을 취급하던 약업자들이 양약의 유통을 담당하였다. 특히 조선 초부터 수도 한성의 약재상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구리개(현 을지로) 지역 한국인 약업자들은 1909년 9월 조선약업총합소를 조직하였는데 총합소의 친목 도모와 운영비를 모으기 위해 장진계(長進契)도 운영하였다. 장진계 회원들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반포한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과 관련한 양약 관련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14년 7월부터 3개월간 ‘약품취급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습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약학교육 강습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강습회가 성황리에 끝난 것을 계기로 조선약업총합소 회원들은 약학교육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조선약학강습소’가 1915년 6월 12일 개교하였다. 그러나 조선약학강습소는 1년제 속성 교육기관이었던 탓에 1년만의 공부로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약제사 시험에 합격할만한 실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이에 1918년 약제사 양성을 위한 정식 교육기관인 ‘조선약학교’가 1918년 6월 20일 종로 5정목 동대문 분서(分署) 자리에서 99명의 학생을 데리고 입학식을 거행하며 개교하였다.
조선약학교는 당시에는 보기 힘든 남녀공학으로 운영되는 학교였다. 조선약학교는 1924년 3월 최초의 한국인 여자 졸업생 3명을 배출하는데 김순복, 차순석, 김려운이 그들이다. 조선약학교가 1930년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된 후 1932년 경 여학생의 입학을 불허하여 마지막 여자 졸업생이 나오는 1934년까지 총 16명의 여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들 가운데 동대문부인병원에서 약제사로 근무한 이들은 현재 총 4명으로 파악된다. 김순복, 차순석, 구명순, 김인명 약제사가 그들인데 이들은 모두 조선약학교의 수업연한이 2년이었던 초창기 특별과 졸업생들이었다.
김순복(金淳福)은 1901년생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으로 19세 때 평양 숭현여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지역 기독교 여전도대에서 대외활동을 시작으로 가정 내 구습 타파와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해방과 관련한 강연, 잡지발간, 사회단체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특히 여성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했던 그는 스스로 22세였던 1922년 4월 조선약학교에 입학하여 최초의 한국인 여자 약제사가 되었다. 김순복은 졸업 직후 동대문부인병원 약제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다시 조선약학교 본과(3년제 과정)에 재입학하여 1년을 더 공부한 후 1929년 3월 졸업을 하고 6월에 정식으로 조선총독부로부터 약제사 면허증을 받았다.
차순석(車純錫)은 1899년생 평안남도 평양 출신으로 평양 숭의여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재학 당시 숭의여학교 결백단(潔白團)의 일원으로 전국을 다니며 여성계몽운동에 동참하였다. 1922년 9월 조선약학교에 입학한 그는 1924년 3월 졸업 후 김순복과 함께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3년간 근무한 차순석은 함흥제혜병원으로 옮겨 3년을 근무한 후 다시 동대문부인병원으로 돌아와 2년간 근무하고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김순복과 차순석은 조선약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기간 ‘의약간(醫藥看) 여자기독청년회’ 활동도 함께 하였다. 단체명을 보았을 때 의학, 약학, 간호 활동을 하는 여성들로 조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체는 동대문부인병원에 본부를 두고 1920년대 위생강연, 노동야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조선약학교를 졸업하고 약제사로 활동하면서 1928년 로제타 홀 의사가 주도한 여자의학강습소 설립을 위한 준비에도 동참하였는데, 특히 김순복은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 기성회 이사로 선임되어 여자의학강습소 개설의 중심 인물로 참여하였다.
구명순과 김인명은 모두 1924년 4월 조선약학교에 입학했는데 구명순(具命順)은 1900년생 경상남도 김해군 출신으로 기장여자청년회 서기로 활동한 바 있으며 정신여학교를 졸업하였다. 김인명(金仁明)은 1905년생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조선약학교에 입학하기 전 정주에서 1921년 여자교육청년회를 창립해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23년 평양 숭의여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약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1926년 3월 조선약학교 졸업과 함께 동대문부인병원에서 약제사로서의 전문 의료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근무한 이들 4인은 조선약학교 특별과 졸업생으로 이들은 졸업 후 별도의 약제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조선총독부에서 발급하는 정식의 약제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약제사 면허를 받기 전 약학교를 졸업한 신분으로 동대문부인병원에서 약제사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김순복과 김인명만이 조선총독부에서 발급한 약제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김순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과 과정 1년을 더 다닌 후 무시험으로 약제사 면허(면허번호 150번)를 받았다. 김인명은 1931년 2월이 되어서야 약제사 면허(면허번호 203호)를 받았는데, 김순복의 경우처럼 다시 본과 과정을 다니고 무시험으로 받은 것인지 약제사 시험에 응시하여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동대문부인병원에서의 활동은 이들의 추가 공부나 약제사 시험 응시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구명순과 김인명의 졸업 이후 1929년부터 1934년 사이 배출된 11명의 여성 약제사 가운데 동대문부인병원에서 일한 이들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남은 자료로는 알 수가 없다.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근무했던 4명의 여성 약제사들 역시 언제까지 이곳에서 근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전문 교육을 받아 배출된 당시 새로운 직종인 약제사, 특히 여성 약제사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와 그들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었던 첫번째 공간이 동대문부인병원이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병원의 입장에서도 1920년대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은 한국인 약제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약의 조제와 관리를 위한 약제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병원의 전문성 강화 및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동대문부인병원은 환자의 질병 치료라는 병원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목적 외에도 당시 의료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장, 전문 직업 여성으로서 그들의 능력을 펼쳐보일 수 있는 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간이었던 셈이다.

.jpg)